FTA가 있어도, 안 지키면 끝이다
한미 FTA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산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름은 상호관세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징벌 조치다.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은 고작 0.7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앞세웠다. 이쯤 되면, 협정이라는 건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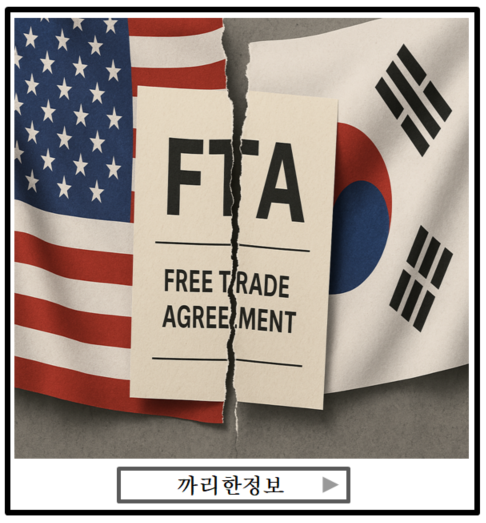
‘탈중국’이 해답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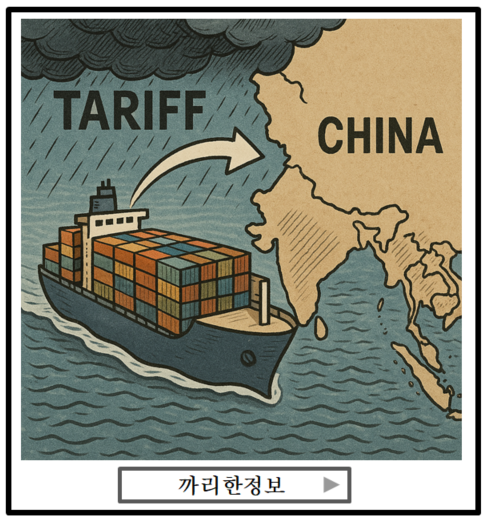
베트남,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은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며 수많은 기업의 투자처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전략이 무력화되었다. 베트남은 무려 46%의 관세, 대만은 32%, 일본도 24%. 심지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던 기업들이 많은 대만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 TSMC는 147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 소프트뱅크는 700조 원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투자 유치는 ‘면책’이 아닌 ‘무력’이었다.
한국은 왜 반격하지 못하는가?

EU나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미국도 알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내수 중심 자립형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가격 결정력이 없다. 무역으로 수익은 낼 수 있지만,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한 마디로, "부자인데 권력이 없는 구조"다. 이런 배경 때문에 보복 관세는 선택지에 없다. 대응 불가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도 상징적이다.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이 따를 것이다.”
FTA보다 강한 건, 정치다

FTA 체결만으로 무역이 안전하다는 시대는 끝났다. 미국의 정책 방향 하나로 글로벌 무역 환경은 하루아침에 뒤집힌다. 지금의 관세 부과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다. 미국 내부 산업 재편과 정치적 메시지가 얽힌 조치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관세율이 26%로 적시되었고, 그 차이에 대한 해석과 조사는 진행 중이다.
결국 우리는 협정의 조항보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더 민감하게 지켜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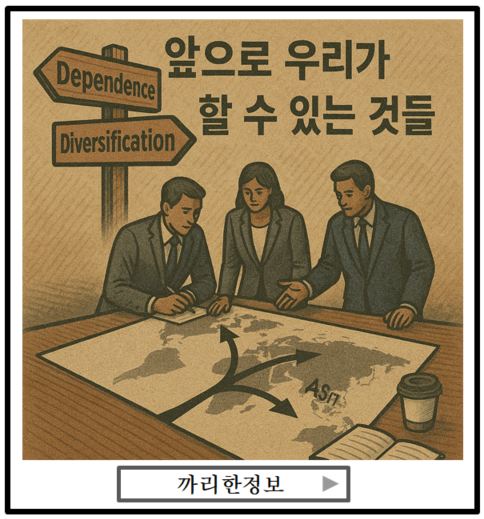
-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동남아, 인도, 유럽 등으로 확장
- 기술 내재화 강화: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 FTA 전략 수정: 다자 협정 위주의 포지션 재정립
- 환율 및 외환 정책 관리: 간접 리스크 방어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상황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엔 미국이었지만, 다음은 또 어디일지 모른다. 관세 전쟁은 단발성이 아니다. 구조화된 위협이다.
간략 정리: 지금 우리가 마주한 '관세 전쟁'의 실체

한미 FTA는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실제로는 무력화됐다. 미국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일방적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통상 질서가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탈중국’ 전략도 더 이상 면책이 아니며, 투자와 협력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국가들조차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맞았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보복도 못 하고, 시장에 종속된 무역 구조 속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FTA가 아닌 생존 전략이다.
'이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워렌 버핏은 왜 지금, 종합상사에 꽂혔을까? (4) | 2025.04.17 |
|---|---|
| 관세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미국, 과연 통할까? (3) | 2025.04.16 |
| 2025년 청년 정책, 28조 지원! 뭐가 바뀌었을까요? 꼭 챙겨야 할 혜택만 정리해드릴게요 (3) | 2025.04.03 |
| 공매도, 오랜만에 다시 열린 판…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6) | 2025.04.02 |
| 2025 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제대로 될까? (2) | 2025.03.19 |



